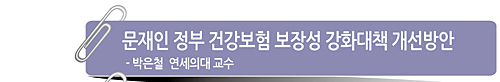- 건전하고 지속적인 건강보험과 보장성 강화 -

장기불황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미국과 유럽은 1980년대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택했다. 복지가 잘 돼 있고 대부분이 좌파정권인 유럽 국가들은 케인즈 대신 프리드리만과 하이에크를, 복지 대신 성장을 원했다.
신자유주의의 주요 골자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노동의 유연성과 함께 복지예산을 줄이는 것이다. 인상적인 점은 노조를 포함한 좌파세력이 복지 축소를 요구한 것이다.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후 사회적 화두 중 하나는 '신자유주의'였다. 복지가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증가해 복지 예산이 해마다 늘어났다. 보수 정권이 집권한 기간에도 복지 비용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정부 예산 중 보건복지 예산은 2007년 7.4%(11조 5000억 원)에서 2015년 12.8%(33조 1000억 원)로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정부 예산은 1.7배 증가한 반면 보건복지 예산은 연평균 16.8% 증가해 2.9배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보다 복지가 취약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일자리·건강보험 보장성 문제 등을 통해 복지를 향상하려 하고 있다.
2016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65조 1874억 원으로 2007년 32조 3142억 원에 비해 두 배로 뛰었다. 보건의료계의 화두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건보 급여비이며, 어떻게 의료비 상승을 막을까 골몰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다.
중국·인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등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은 8% 안팎을 기록했지만 미국·독일·프랑스·스웨덴은 2%대에 머물러 있다. 물론 경제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부유한 국가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후자의 나라가 국민소득이 훨씬 높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 2016년까지 건강보험 급여비 연평균 증가율이 9.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매우 높은 편이지만 마찬가지로 국민의료비가 높다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건강보험 특위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9.0%인데 비해 우리는 7.1%로 35개 OECD 국가 중 28번째이다.
복지비용이 증가하는 것처럼 의료비는 아무리 억제하려 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의료비의 파이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 늘려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다. 즉, 현재는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다.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을 보면 입원이 11.2%, 요양병원은 29.5%, 70세 이상에서 14.8%였으며, 진료비중 점유율이 높아지는 항목은 입원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다. 이를 분석하면 의료비 지출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유는 급속한 노령인구의 증가와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만성질환의 증가, 이에 따른 입원환자의 증가, 생활수준 향상으로 의료기관 이용 증가, 병원시설의 고급화, 각종 검사 특히 영상진단장비의 고급화와 로봇수술과 같은 고가의 수술·처치법 도입, 요양병원·실손보험의 성장 등이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의료비 파이를 늘릴 수밖에 없다.
저수가를 말하면 의료비 파이를 늘리자는 주장이 결국 수가인상을 통해 배를 불리려는 수작으로 곡해되는 현실을 감안해 말을 아끼고 싶지만 한 가지 지적하자면 우리나라는 의료비 지출이 낮다는 점이다. 2014년 기준 기대수명은 82.2년, 건강수명은 73세로 OECD 평균(80.8세/71세)을 넘어 적은 투자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율은 6.12%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10% 이상이고, 안정적인 공적재원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범위가 넓다.
<OECD 건강통계 2017>을 보면 2016년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 지출 비중은 56.4%로 OECD 평균(72.5%) 보다 매우 낮다. 경상 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의 비중이 한국과 같거나 낮은 나라는 라트비아(56.4%)·멕시코(51.7%)·미국(49.1%) 등 3개국뿐이다.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36.8%로 OECD 평균(20.3%)에 비해 1.8배 가량 높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적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외면한채 비급여 진료항목이 많은 탓을 하며 비급여를 없애 의료비 가계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한다.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정부가 목표한 건강보험 보장률 70%(현재 6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 투입 비중을 64%까지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장성 강화와 무관하게 국고지원 등 공공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비 상승 원인의 하나로 의료이용률이 높다고 지적한다. 수가가 낮으니 이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대형병원 조차 문턱이 낮고, 별다른 제약이 없으니 환자가 몰리고, 일차의료는 점점 위축된다. 의사에게 의료이용률 증가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각은 매우 왜곡된 것이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특히 대형병원의 이용률을 더 증가시킬 것이다. 시급히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률을 억제하려면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정비해 본격적으로 일차의료 중심의 책임진료기구(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등을 조직하고, 통합의료 공급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일차의료가 붕괴하면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가 낮고, 국고지원 등 공적 재원이 적어 건강보험 주머니가 작기 때문에 제대로 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건전하고 지속적인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라는 단 열매를 약속하기 전에 건강보험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진솔하게 국민을 설득해야 하며, 구체적인 재원 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재정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정부는 솔직해 져야 한다.